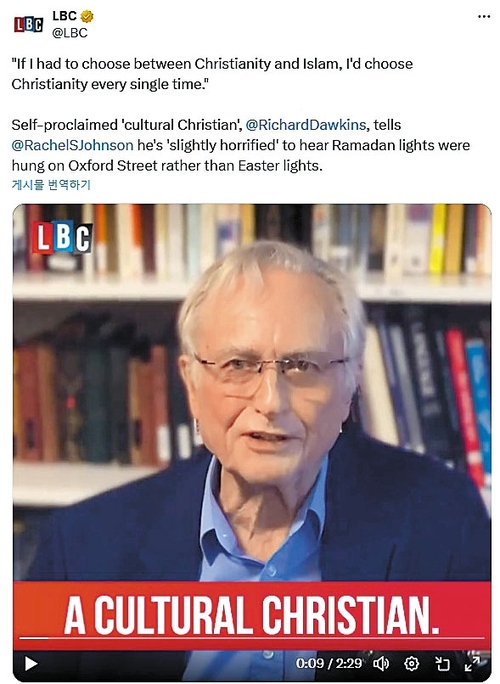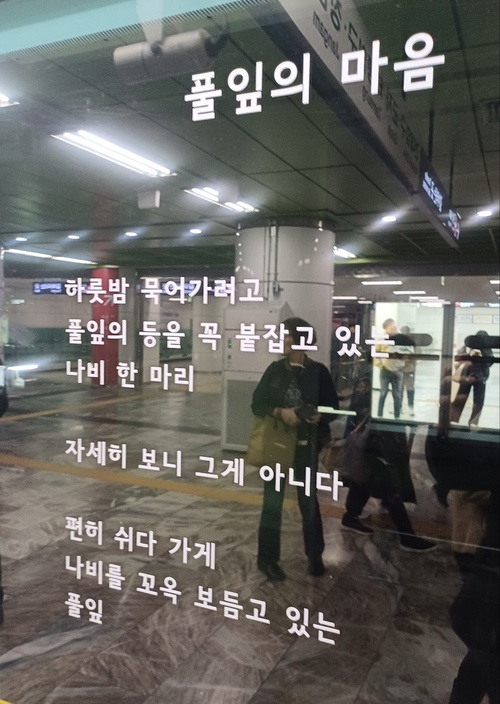터가 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을 위한 굿
박현선 ‘생활의 발견’● 너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 무섭지 않니?터가 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을 위한 굿터가 세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집을 위한 굿
화성 팔탄면 덕천리는 도심 속을 금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져 있는 한적한 마을이다. 넓디넓은 저수지는 각양각색의 연꽃 무리가 이쁜 색동 이불을 덮고 있는 듯 하다. 논밭과 나지막한 산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소꿉놀이하듯 펼쳐져있는데, 마치 옛 고을과 닮은꼴이다. 이십여 년 전 이 맘때쯤 뜨거운 태양이 심술부리던 때의 일이다.
마을과 저수지를 끼고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과정에 조합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찾고 있었다. 원주민으로 부동산을 운영하는 박 사장은 S온천 앞에 2층으로 된 건물 이 거저 얻는 가격으로 매물이 나왔다고 매입 의사를 물어왔다.
지금은 폐건물이지만 수리하고, 실내장식을 하면 쓸 만하다는 말에 놓칠세라 서둘러 건물을 매입하였다.
나무로 지어진 2층 건물이었다. 1층은 일식집을 하였던 것으로 보였다. 방 서너 개가 일렬로 기차처럼 붙어있었으며, 금방 이라도 타액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이 입을 쩍 벌린 청동으로 만 든 물소 머리 장식, 먹을 갈아 붓으로 모란꽃을 그려넣은 액자가 고급스럽게 꾸며져있었다. 바닥에는 탁자와 의자가 널브러져 있었고, 온갖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었다. 여기저기 대나무 그림으로 멋을 부린 그릇들이 깨어진 채 내팽겨져 집기와 뒤섞여 나뒹굴고 있었다. 2층은 밖에서 나무 층계를 밟고 올라가야 했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삐걱하는 기분 나쁜 소리가 났다. 2층은 텅 비어있는 사무실과 휴게점을 운영하였던 곳으로 빨간 소파와 테이블이 싸움하듯 뒤엉켜있었다.
급하게 수리를 해야 했다. 건물 옆에서 온천부동산을 운영하는 박 사장을 찾아갔다. 외지인이 1년 전에 1층 전체를 임대하여 일식집을 운영했었다고 한다. 실내장식을 고급지게 꾸며 놓고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없었다. 일식집 주인은 운영에 한계를 느꼈고, 상심한 나머지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매일 술에 절어 지내다가 스스로 세상을 버렸단다. 소가 노니는 한가로운 곳에 고급 일식집이라니! 시장 조사만 잘했더라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텐데.
박 사장은 건물의 터가 너무 세서 사람이 죽어나가니 눌러주고, 넋을 위로해주어야 앞으로 들어오는 사람도 잘 된다고 했다. 무조건 굿을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다. 늦은 시간이 좋다 고 하여 어둠이 깔린 늦은 저녁으로 정하였다. 모태 신앙 기독교인 남편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자리를 피하였다. 2층으로 원주민식당에서 파란 물 장화를 신고 일하는 아주머니,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이 10여 명 넘게 모여들었다.
화려한 무복으로 치장한 무녀는 얼추 마흔 살쯤 되어보였고, 얼굴이 둥글둥글하며 눈매가 매서웠다. 촛불을 밝히고, 떡과 과일의 재물을 차려놓았다. 꽹과리와 장구를 치는 요란한 소리 에 맞추어 축원을 쏟아내었다. 무녀는 갑자기 쇳소리처럼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여기 대주가 누구냐!”라고 소리쳤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나를 쳐다봤다. 앞으로 나오라고 하여 엉겁결에 나갔다. 깃발을 보이며 뽑으라고도 하고, 흰 천을 내 몸에 둘둘 말아 묶기도 하였다. 생전 처음 당하는 이 괴이한 행동에 공포감이 밀려와 손끝이 부르르 떨렸다.
무녀는 1층에서 목을 매고 자살한 사람의 혼이 아직도 머물러 있으니 나에게 “그 장소로 가서 술을 뿌려주면서 망자를 달래주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캄캄한 곳으로 촛불에 의지하고 술을 들고 폐허가 되어 있는 일식집으로 들어갔다. 침이 마르고 가슴이 요동치며 등에 굵은 땀이 흘렀다. 비린내 같은 역한 곰팡내가 난다. 무언가 절규하며 아픔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들려 오는 것 같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나의 그림자가 출렁인다. 숨이 막힐 듯 조용하고 바람도 없는데, 몸은 균형을 잃어 쓰러질 것만 같았다. 해골바가지로 물을 떠 마신 것같이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움이 몰려왔다.
나 홀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암실처럼 불빛이 거의 없는 구불구불한 달구지길, 가쁜 호흡을 내쉬며 지나야 했다. 오직 라이트만을 의지한 채 군데군데 묘지가 흩어져있는 산길을 더듬으 며 지난다. 뭔가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다. 순간 정적을 깨고, 차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말을 한다. “너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 무섭지 않니?” 박현선(수필가)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문화산책
많이 본 기사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