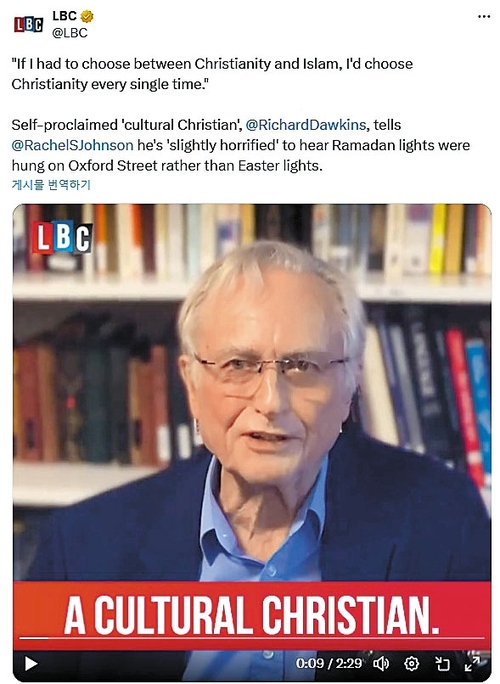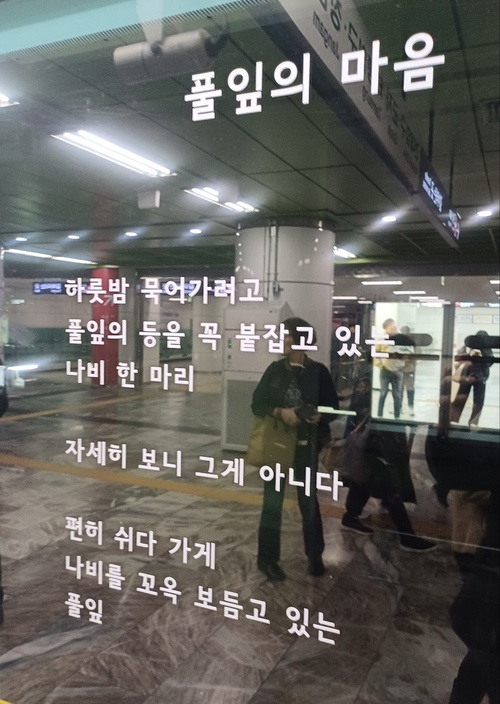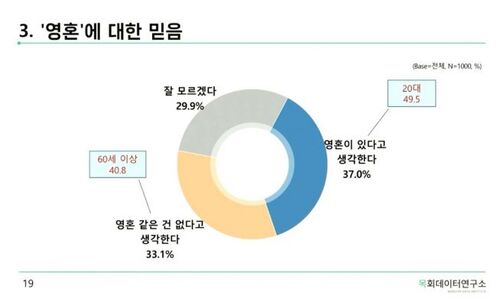|
소인배와 군자, 그리고 경계인 한 달 전쯤 지인의 초청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전 씨와 양 씨, 김 씨 세 사람과 경기도 양평의 한 별장으로 놀러갔다. 남자끼리의 나들이라 1박 2일 동안의 식사는 우리가 해결해야 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먹을거리를 사러 양평 읍내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물건을 고를 때였다.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던 전 씨가 양 씨에게 술이 적다고 하자, 양 씨가 김 씨에게 술을 더 사라고 하였고, 김 씨는 이에 군말 없이 응했다. 평소 양 씨는 전 씨를 깍듯이 모셨다. 두 사람은 모 기관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사이라지만, 양 씨가 전 씨를 대하는 태도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였다.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는 폼은 조폭 세계의 한 장면을 떠오르게 했다. 전 씨와 양 씨는 그렇다 쳐도, 친숙하지 않은 양 씨와 김 씨 사이에도 묘한 관계가 형성돼 있음이 느껴졌다. 이를 테면 동물들의 ‘서열’ 같은 것이…. 별장에 도착하니 서서히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김 씨는 밥을 하고, 고기 굽는 일을 맡았고, 나는 밭에 나가 상추와 쑥갓 등을 뜯어와 물에 깨끗이 씻어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리는 동안 전 씨와 양 씨는 방 안에서 TV를 보며 희희낙락 시간을 보냈다. 나와 김 씨와 주인장의 분주한 손놀림으로 제법 푸짐한 밥상이 차려졌다. 일행은 소쿠리에 가득 찬 무공해 채소에 삼겹살을 싸서 먹으며 소주 4병을 비웠다. 전 씨와 양 씨가 유일하게 상에 올려놓은 것은 질펀한 찬사였다. 먹는 것 가지고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 씨와 양 씨는 먹기도 잘하고, 마시기도 잘했다. 나와 김 씨, 주인장은 소식했고, 술도 한 잔 정도 마셨을 뿐이다. 귀찮은 설거지도 나와 김 씨가 처리했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느닷없이 전 씨가 화투놀이를 제안했다. “주인장 화투 없어요? 우리 밥 먹었는데 화투나 합시다.” “어쩌지요, 별장에는 화투가 없는데….” 천만다행이었다. 공기 좋은 곳에 왔으니, 밖에 나가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산책이나 하고 싶었다. 잠시 후 무료했던지 전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다. “노래방 갑시다.” 주인장의 안색이 변했다. 노래방을 가려면 야밤에 비포장도로인 산길을 따라 한참을 가야 한다. 주인장과 김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2~3분 정도 어색한 시간이 흘렀다. 침묵에 겨워하던 양 씨가 전 씨를 거들며 주인장의 등을 떼밀었다. 마지못해 주인장이 일어섰고, 무언의 압력을 느낀 김 씨도 자발적으로 따라나섰다. 나는 감기 기운이 있다는 핑계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서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뻔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두어 시간쯤 지나 돌아온 주인장에게 살며시 물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노래방비는 주인장이 내고, 술값은 김 씨가 냈을 뿐더러 전 씨와 양 씨의 온갖 심부름까지 했다고 한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나자, 이번에는 양 씨가 열변을 토했다. 가평 어느 계곡에 기가 막힌 매운탕집이 있으니 먹으러 가자는 것이었다. 양 씨의 체면을 생각해서인지 주인장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날 오전 차로 1시간 30분을 달려 매운탕 집에 당도했다. 전 씨와 양 씨의 너스레는 이 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이윽고 음식 값을 계산할 때가 되었다. 먹을 때 입심을 자랑하던 전 씨는 갑자기 조용해졌으며, 양 씨는 자기가 계산하겠다고 큰소리치며 주머니에 손을 넣긴 했지만 액션에 불과했다. 결국 돈은 내가 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누웠으나 잠은 오지 않고 전 씨와 양 씨, 김 씨의 얼굴만 어른거렸다. 달갑지 않던 사람들과의 불편했던 여행이었는데, 공연히 전 씨와 양 씨의 종노릇만 하고 온 것은 아니었는지 씁쓰름했다. ‘상대는 나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고, ‘남자는 지갑을 잘 열어야 멋지다’는 말도 있다. 당시의 상황을 곰곰이 생각해 봤다. 전 씨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만 하찮은 사람이고, 양 씨는 전 씨의 비위를 맞추며 자기 욕심을 채운 약삭빠른 인물일 뿐이다. 이에 반해 두 사람의 시중을 들며 하수인처럼 행세한 김 씨는 군자요, 요즘말로 대인배였다. 그날 나는 그 경계에 서 있지 않았을까. <이승주 논설위원> <저작권자 ⓒ CR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모바일 상단 구글 배너
|